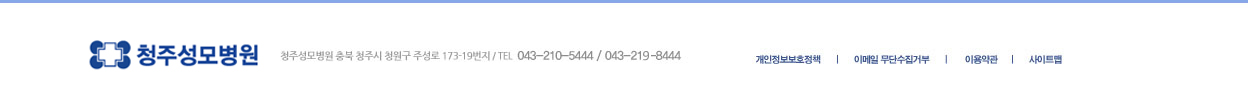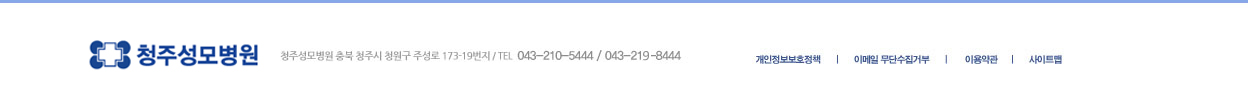|
|
 |
 |
|
мғҒмЈјн‘ңмӢң
|
· мҷ„мһҘм°©мҡ©(лӮЁмһҗ)
мҷ„мһҘмқҖ мӮјлІ лЎң л§Ңл“Өм–ҙ мЎҢмңјл©°, кІҖмқҖ мғүмқҳ мӨ„мқҙ мһҲлҠ”кІғкіј мӨ„мқҙ м—ҶлҠ” кІғмңјлЎң кө¬л¶„н•ңлӢӨ.
л‘җмӨ„ : м•„л“Өкіј мӮ¬мң„, м•„л“Өмқҙ м—Ҷмқ„ кІҪмҡ° мһҘмҶҗмқҙ м°©мҡ©н•ңлӢӨ.
н•ңмӨ„ : кё°нҳјмқё ліөмқё (мғҒліөмқ„ мһ…м§Җ м•Ҡкі мҷ„мһҘл§Ң м°©мҡ©мқ„ н•ҙлҸ„ ліөмқёмқҙ лҗңлӢӨ)
л¬ҙмӨ„ : лҜёнҳјмқё ліөмқё (мЈјлЎң мҶҗмһҗл“Өмқҙ м°©мҡ©н•ҳкІҢ лҗңлӢӨ.)
- ліөмқёмқҖ мғҒліөмқ„ мһ…мқҖ мӮ¬лһҢмқ„ ліөмқёмқҙлқј л§җн•ҳл©° м№ңк°ҖмӘҪ ліөмқёмқҳ лІ”мң„лҠ” кі мқёмқҳ 8мҙҢмқҙлӮҙмқҳ м№ңмЎұмқҙл©° мҷёк°ҖлҠ” мҷёмӮ¬мҙҢмқҙлӮҙ, л¶ҖлӘЁм—җ н•ң н•ңлӢӨ.
|
· мғҒмһҘм°©мҡ©(лӮЁмһҗ,м—¬мһҗ)
мһҘлЎҖлҘј л§Ҳм№ң нӣ„ мғҒмқ„ лӢ№н–ҲлӢӨлҠ” н‘ңмӢңлҘј н•ҳлҠ” кІғмқ„ л§җн•ңлӢӨ.
лӮЁмһҗлҠ” мӮјлІ лЎң л§Ңл“ лҰ¬ліёмқ„ мҷјмӘҪ к°ҖмҠҙм—җ л¶Җм°©н•ңлӢӨ.
м—¬мһҗлҠ” л¬ҙлӘ…мІңмңјлЎң л§Ңл“ лЁёлҰ¬н•Җ лҰ¬ліёмқ„, лӮЁмһҗк°Җ мғҒмқ„ лӢ№н–Ҳмқ„ кІҪмҡ° мўҢмёЎлЁёлҰ¬м—җ м—¬мһҗк°Җ мғҒмқ„ лӢ№н–Ҳмқ„ кІҪмҡ° мҡ°мёЎлЁёлҰ¬м—җ лҰ¬ліёмқ„ кҪӮлҠ”лӢӨ.
- мғҒмһҘмқҖ мһҘлЎҖлҘј л§Ҳм№ң нӣ„ нғҲмғҒ л•Ңк№Ңм§Җ м§Ғкі„к°ҖмЎұл§Ң м°©мҡ©н•ңлӢӨ. |
|
м ңмӮ¬мқҳ мў…лҘҳ |
мһ…кҙҖмқҙ лҒқлӮҳкі лӮЁВ·л…Җ мғҒмЈјл“Өмқҙ м •мӢқмңјлЎң мғҒліөмқ„ мһ…кі , 분н–ҘмҶҢм—җм„ң м ңмҲҳлҘј мҳ¬лҰ¬кі , н–Ҙмқ„ н”јмҡ°л©° мІ« м ңмӮ¬лҘј мҳ¬лҰ¬лҠ”лҚ° мқҙкІғмқ„ м„ұліөм ңлқј н•ңлӢӨ. (мң көҗмҷҖ л¶ҲкөҗмӢқм—җм„ң н–үн•Ё)
вҖ» мөңк·јм—җлҠ” м„ұліөм ңлҘј мҳ¬лҰ¬кё° м „м—җ мғҒліөмқ„ мһ…лҠ” кІҪн–Ҙмқҙ мһҲлӢӨ. |
мһҘм§ҖлЎң л– лӮҳкё° м „ 분н–ҘмӢӨм—җм„ң м ңл¬јмқ„ мӨҖ비н•ҙ м§ҖлӮҙкё°лҸ„ н•ҳл©°, ж•…дәәмқ„ мҳҒкө¬м°Ём—җ лӘЁм…” лҶ“кі м§ҖлӮҙлҠ” м ңмӮ¬лҘј л°ңмқём ңлқј н•ңлӢӨ.
л°ңмқём ң мқҳлҜёлҠ”гҖҺж•…дәәмқ„ мң нғқ(л¬ҙлҚӨ)мңјлЎң лӘЁмӢңкі мһҗ н•ҳмҳӨлӢҲ мқҙм„ёмғҒм—җм„ң лӢӨмӢң лөҷм§Җ лӘ»н•ҳлҠ” мҳҒмӣҗн•ң мқҙлі„лЎң ж•…дәәмқҳ нҸүм•Ҳмқ„ 비лҠ” л§ҲмқҢгҖҸм—җм„ң м§ҖлӮҙлҠ” м ңмӮ¬мқҙлӢӨ. |
| мһҘм§ҖлЎң к°ҖлҠ” лҸ„мӨ‘м—җ нҸүмҶҢ ж•…дәәмқҙ м• м°©мқҙ мһҲлҚҳ кіімқҙлӮҳ, мӮҙм•ҳлҚҳ кіім—җ л“Өлҹ¬ м§ҖлӮҙлҠ” м ңмӮ¬лҘј л§җн•ңлӢӨ. |
л¬ҳмқҳ кҙ‘мӨ‘мқ„ нҢҢкё° м „м—җ мҳ¬лҰ¬лҠ” м ңмӮ¬лҘј л§җн•ңлӢӨ.
мӮ¬нҶ м ң мқҳлҜёлҠ” мқҙ кіім—җ кҙ‘мӨ‘мқ„ м„ёмҡ°лӢҲ мӢ (зҘһ)к»ҳм„ң ліҙмҡ°н•ҳмӮ¬ нӣ„н•ңмқҙ м—ҶлҸ„лЎқ м§Җмјң мЈјкёё 비 лҠ” л§ҲмқҢм—җм„ң м§ҖлӮҙлҠ” м ңмӮ¬лӢӨ.
- кҙ‘мӨ‘мқҙлһҖ л•…мқ„ мӮ¬к°ҒмңјлЎң нҢҢм„ң кҙҖмқ„ лӘЁмӢңлҠ” мһҗлҰ¬ |
| мһҘмӮ¬м§ҖлӮј л•Ң кҙҖмқ„ л¬»кі нқҷмңјлЎң л©”мҡ°кё° мӢңмһ‘н•ҳм—¬ нҸүм§ҖмҷҖ к°ҷмқҖ лҶ’мқҙк°Җ лҗҳл©ҙ м§ҖлӮҙлҠ” м ңмӮ¬лӢӨ. нҸүнҶ м ңлҠ” л§ҸмӮ¬мң„к°Җ лӢҙлӢ№н•ҳлҠ” кІғмқҙ кҙҖлЎҖлЎң лҗҳм–ҙмһҲлӢӨ. |
6.м„ұ분м ң(жҲҗеўізҘӯ):лҙү분м ң |
мһҘм§Җм—җм„ң лҙү분(л¬ҙлҚӨ)мқ„ л§Ңл“ л’Өм—җ м§ҖлӮҙлҠ” м ңмӮ¬лӢӨ.
м„ұ분м ң мқҳлҜёлҠ” л¬ҙлҚӨмқ„ м—¬кё°м—җ м •н•ҳмҳҖмңјлӢҲ мӢ к»ҳм„ң ліҙмҡ°н•ҳмӮ¬ нӣ„н•ңмқҙ м—ҶлҸ„лЎқ м§Җмјң мЈјкёё 비 лҠ” л§ҲмқҢм—җм„ң м§ҖлӮҙлҠ” м ңмӮ¬лӢӨ. |
| мҙҲмҡ°м ңлҠ” мӮ°мҶҢм—җм„ң мһҘлЎҖлҘј лҒқлӮҙкі м§‘м—җ лҸҢм•„мҷҖм„ң м§ҖлӮҙлҠ” м ңмӮ¬ |
| мһ¬мҡ°м ңлҠ” мӮ°м—җм„ң лҸҢм•„мҳЁ лӢӨмқҢлӮ мӢқм „м—җ м§ҖлӮҙлҠ” м ңмӮ¬лӢӨ.
к·ёлҹ¬лӮҳ мҡ”мҰҲмқҢмқҖ мһ¬мҡ°лҘј мғқлһөн•ҳлҠ” кІҪмҡ°к°Җ л§ҺлӢӨ |
л°ңмқён•ң лӮ лЎңл¶Җн„° мқҙнӢҖм§ё лҗҳлҠ” лӮ мӮ°мҶҢм—җм„ң м§ҖлӮҙлҠ” м ңмӮ¬лӢӨ.
- мҡ°м ңлҠ” лҸҢм•„к°ҖмӢ мҳҒнҳјмқ„ мң„лЎңн•ҳлҠ” м ңмӮ¬лЎңмҚЁ 집м—җ лҸҢм•„мҳЁ мһҗмҶҗл“Өмқҙ ж•…дәәмқ„ нҷҖлЎң л¬ҳмҶҢ м—җ лӘЁм…” лҶ“кІҢ лҗҳм–ҙ мҷёлЎӯкі лҶҖлқјм§Җ м•Ҡмқ„к№Ң кұұм •лҗҳм–ҙ мҳҲлҘј л“ңлҰ¬лҠ” мқҳмӢқмқҙлӢӨ |
мһ„мў…н•ҳмӢ лӮ л¶Җн„° 49мқјмқҙ лҗҳлҠ” лӮ м§ҖлӮҙлҠ” м ңмӮ¬лӢӨ.
49м ң мқҳлҜёлҠ” л¶Ҳкөҗ н–үмӮ¬лЎңм„ң мңЎмІҙлҘј мқҙнғҲн•ң мҳҒнҳјмқҖ л°”лЎң к·№лқҪмңјлЎң к°Җм§Җ лӘ»н•ҳкі мҳЁк°– м„ёнҢҢм—җм„ң м Җм§ҖлҘё мЈ„м•…мқ„ м •нҷ”н•ҳлҠ” кё°к°„мқҙл©°, м–ҙлҠҗ кіімңјлЎң к°Ҳ кІғмқём§Җ м •н•ҙм§Җм§Җ м•Ҡм•„ мӢ¬нҢҗмқҳ кІ°кіјлҘј кё°лӢӨлҰ¬лҠ” кё°к°„мқ„ 49мқјлЎң ліҙкі мһҲм–ҙ к°ҖмЎұл“ӨмқҖ мҳҒнҳјмқҙ мўӢмқҖ кіімңјлЎң к°Җкё°лҘј кё°мӣҗн•ҳлҠ” л§ҲмқҢм—җм„ң м§ҖлӮҙлҠ” м ңмӮ¬лӢӨ.
* мҳӨлҠҳлӮ 49м ңлҠ” л°ңмқёмқјлЎң л¶Җн„° 49мқјм—җ н•ҙлӢ№н•ҳлҠ” лӮ м—җ 49м ңмқ„ н–үн•ҳкё°лҸ„ н•ңлӢӨ. |
| кі мқёмқҙ лҸҢм•„к°ҖмӢ лӮ н•ҙл§ҲлӢӨ н•ңлІҲм”© м§ҖлӮҙлҠ” м ңмӮ¬лӢӨ. м§ҖлӮҙлҠ” мӢңк°„мқҖ мһҗм •м—җ м§ҖлӮҙлҠ” кІғмқҙ мӣҗм№ҷмқҙлӢӨ. |
|
| |
|
| л°ңмқёмӢңм—җ кҙҖ лӮҳк°ҖлҠ” л°©н–Ҙ |
· м•Ҳм№ҳмӢӨм—җм„ң л°ңмқёмһҘмңјлЎң лӘЁмӢӨ л•Ң
кё°лҸ…көҗ,л¶Ҳкөҗ,мқјл°ҳ : мғҒ(дёҠ, лЁёлҰ¬ мӘҪ)мқҙ лЁјм Җ лӮҳк°„лӢӨ.
мІңмЈјкөҗ : н•ҳ(дёӢ, лӢӨлҰ¬ мӘҪ)мқҙ лЁјм Җ лӮҳм•„к°„лӢӨ.
- мІңмЈјкөҗлҠ” мЈҪмқҖ мқҙлҘј мӮ° мӮ¬лһҢмңјлЎң к°„мЈјн•ҳм—¬ л‘җл°ңлЎң кұём–ҙ лӮҳк°ҖлҠ” кІғмқ„ мқҳлҜён•ҳкё°л•Ңл¬ёмқҙлӢӨ.
|
| мһ„мў… нӣ„ мӨҖ비м„ңлҘҳ |
· мӮ¬л§қ진лӢЁм„ң
кі мқёмқҳ мЈјлҜјл“ұлЎқмҰқ л°Ҹ көӯлҜјкұҙк°•ліҙн—ҳмҰқмқ„ к°Җм§Җкі лі‘мӣҗ мӣҗл¬ҙкіјм—җм„ң л°ңкёү л°ӣлҠ”лӢӨ.
м ңм¶ңмІҳ : мһҘлЎҖмӢқмһҘ, лҸҷмӮ¬л¬ҙмҶҢ, көӯлҜјкұҙк°•ліҙн—ҳкіөлӢЁ, нҷ”мһҘмһҘ л“ұ
- мӮ¬л§қ진лӢЁм„ңм—җ мӮ¬л§қмқҳ мў…лҘҳк°Җ мҷёмқёмӮ¬, кё°нғҖ, л¶ҲмғҒмқё кІҪмҡ°лҠ” мӮ¬л§қмһҘмҶҢмқҳ кҙҖн• кІҪм°°м„ңм—җ мӢ кі н•ҳм—¬ кІҪм°° мқҳ м§ҖмӢңлҘј л°ӣм•„м•ј н•ңлӢӨ.
- мһ…кҙҖ м „к№Ңм§Җ 진лӢЁм„ңмҷҖ кІҪм°°м—җм„ң л°ңкёүн•ҙмӨҖ кІҖмӮ¬м§Җнңҳм„ңлҘј л°ҳл“ңмӢң м ңм¶ңн•ҳм—¬м•ј н•ңлӢӨ.
|
|
| мғҒмЈјк°Җ лҗҳлҠ” мӮ¬лһҢ |
- мһҘмһҗк°Җ мғҒмЈјк°Җ лҗҳкі ,
- мһҘмһҗк°Җ мЈҪкі м—Ҷмңјл©ҙ мһҘмҶҗмқҙ мғҒмЈјк°Җ лҗңлӢӨ.
- м•„л“Өмқҙ мЈҪмңјл©ҙ мһҘм„ұн•ң мҶҗмһҗк°Җ мһҲлҚ”лқјлҸ„ л¶Җ(зҲ¶)к°Җ мғҒмЈјк°Җ лҗҳкі ,м•„лӮҙк°Җ мЈҪмңјл©ҙ лӮЁнҺёмқҙ мғҒмЈјк°Җ лҗңлӢӨ.
- мӣҗм№ҷм ҒмңјлЎң мЈҪмқҖ мқҙк°Җ мҶҚн•ң к°Җм •мқҳ к°ҖмһҘмқҙ мғҒмЈјк°Җ лҗңлӢӨ.
|
|
|
|
|
|
|
|
|